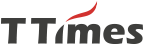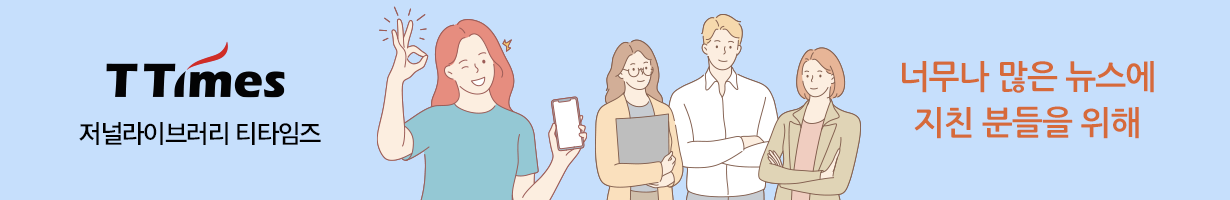아무 준비 없이 떠났던 1월의 베를린. 현지에서 일일 투어가이드를 따라나섰더니 ‘운터 덴 린덴’ 대로로 가장 먼저 일행을 안내한다. 근대부터 현대에 걸친 독일 역사를 담은 박물관과 역사적 건축물들이 죽 늘어선, 우리로 치면 종로나 광화문대로 쯤 되는 거리다.
 길가에 신고전주의 양식의 기둥이 근사해 보이는 작은 건물 ‘노이에 바헤’로 들어가 보라했다. 19세기 프로이센 황제 경비대 초소로 처음 지어졌고 여러 곡절을 거쳐 지금은 ‘전쟁과 폭력 희생자 추모관’으로 쓰이고 있다 한다.
길가에 신고전주의 양식의 기둥이 근사해 보이는 작은 건물 ‘노이에 바헤’로 들어가 보라했다. 19세기 프로이센 황제 경비대 초소로 처음 지어졌고 여러 곡절을 거쳐 지금은 ‘전쟁과 폭력 희생자 추모관’으로 쓰이고 있다 한다.
광기와 질곡의 역사를 겪어낸 자들의 기억과 성찰을 곳곳에 새겨놓은 이 도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기념관이려니 하고 들어선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수십평 되는 공간은 텅 비어있었고 그 한 가운데 온몸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채 잔뜩 웅크린 검은 조각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바로 위 천장은 둥그렇게 뻥 뚫려 있어 겨울의 흐리고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모자의 머리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1938)였다.
 미켈란젤로 ‘피에타’의 현대적 버전이라 할 이 작품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그 느낌은 완연히 달랐다. 피에타가 마리아와 예수의 이야기를 담은 스물네 살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종교적 성취로 빛난다면, 콜비츠의 모자는 속세와 현실 속 인간 ‘어미’의 끊어질 것 같은 심장을 담은 처연함으로 보는 이의 가슴에 맺혀버린다.
미켈란젤로 ‘피에타’의 현대적 버전이라 할 이 작품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그 느낌은 완연히 달랐다. 피에타가 마리아와 예수의 이야기를 담은 스물네 살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종교적 성취로 빛난다면, 콜비츠의 모자는 속세와 현실 속 인간 ‘어미’의 끊어질 것 같은 심장을 담은 처연함으로 보는 이의 가슴에 맺혀버린다.
콜비츠 (1867-1945)는 아들을 1차 세계대전으로 잃었고 손자를 2차 대전에서 잃었다. 작품속의 어머니는 바로 자신이었고, 그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끌어안고 있어도 가셔지지 않는 슬픔의 돌덩어리가 되었다. 그 모습 그대로 일 년 내내 머리위로 내리는 비를 맞고 눈을 맞는다. 비극은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의 비와 눈, 공기는 현재다. 그래서 과거의 그들의 기억은 이곳을 찾는 우리의 현재의 오감과 연결된다.
관광객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는 그 고요 속에서 당연히 머릿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떠오른다. 아, 우리의 슬픔도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과거란 그저 기념관 유리전시장안에 박제처럼 담겨져 한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성의 기억만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온몸을 일깨우는 감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였구나. 멀지 않았던 슬픔과 그 상징마저 시한을 강요받은 우리는 충분한 애도의 기간과 형상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구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어보지 못한 슬픔이 유령처럼 맴돌며 자꾸만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역사와 현재 속에 겹겹이 펼쳐지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떤 모습으로 추념되어야 할까. 우리의 광화문대로는 그런 형상을 품고 우리의 세월을 후대에 생생하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역사와 현재 속에 겹겹이 펼쳐지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떤 모습으로 추념되어야 할까. 우리의 광화문대로는 그런 형상을 품고 우리의 세월을 후대에 생생하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정신없이 전철을 타고 콜비츠의 개인 박물관으로 달려갔다. 이른바 ‘민중미술’의 선구자라 할 만한 그의 그림들 속에서 20세기 초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의 굶주리고 고통스런 표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발하겠다는 절절함이 뜨겁게 다가온다.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 ‘퇴폐예술’로 몰려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뒤에는 더욱더 모성애와 인간애에 몰두한 그가 남긴 후반기의 작품들에서 그는 더욱 강하게 아이들을 끌어안는다.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자식을 혼신을 다해 더욱 꽉 껴안는 모성으로 고통과 절망에 맞서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듯이.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은 나의 유언이다. 이것은 ‘전쟁은 이제 그만’같은 말처럼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명령이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이다.

/사진=flickr
광기와 질곡의 역사를 겪어낸 자들의 기억과 성찰을 곳곳에 새겨놓은 이 도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기념관이려니 하고 들어선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수십평 되는 공간은 텅 비어있었고 그 한 가운데 온몸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채 잔뜩 웅크린 검은 조각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바로 위 천장은 둥그렇게 뻥 뚫려 있어 겨울의 흐리고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모자의 머리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1938)였다.

/사진=이윤정
콜비츠 (1867-1945)는 아들을 1차 세계대전으로 잃었고 손자를 2차 대전에서 잃었다. 작품속의 어머니는 바로 자신이었고, 그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끌어안고 있어도 가셔지지 않는 슬픔의 돌덩어리가 되었다. 그 모습 그대로 일 년 내내 머리위로 내리는 비를 맞고 눈을 맞는다. 비극은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의 비와 눈, 공기는 현재다. 그래서 과거의 그들의 기억은 이곳을 찾는 우리의 현재의 오감과 연결된다.
관광객들조차 숨소리를 죽이는 그 고요 속에서 당연히 머릿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떠오른다. 아, 우리의 슬픔도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과거란 그저 기념관 유리전시장안에 박제처럼 담겨져 한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성의 기억만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온몸을 일깨우는 감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였구나. 멀지 않았던 슬픔과 그 상징마저 시한을 강요받은 우리는 충분한 애도의 기간과 형상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구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어보지 못한 슬픔이 유령처럼 맴돌며 자꾸만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사진=flickr
그런 생각을 하며 정신없이 전철을 타고 콜비츠의 개인 박물관으로 달려갔다. 이른바 ‘민중미술’의 선구자라 할 만한 그의 그림들 속에서 20세기 초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의 굶주리고 고통스런 표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고발하겠다는 절절함이 뜨겁게 다가온다.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 ‘퇴폐예술’로 몰려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뒤에는 더욱더 모성애와 인간애에 몰두한 그가 남긴 후반기의 작품들에서 그는 더욱 강하게 아이들을 끌어안는다. 이런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자식을 혼신을 다해 더욱 꽉 껴안는 모성으로 고통과 절망에 맞서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듯이.

/사진=@public domain
그의 마지막 판화의 제목은 괴테의 글에서 가져온 ‘씨앗들은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1942).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 아이들을 외투로 꼭 끌어안고 있는 그 그림은 자꾸만 짓이겨지는 씨앗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의 가슴을 둔중하게 내려친다. 그는 이 제목과 함께 이렇게 외쳤다.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은 나의 유언이다. 이것은 ‘전쟁은 이제 그만’같은 말처럼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명령이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이다.